

소소한 풍경
박범신
소설은 옛 제자 ㄱ이 선생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물어 본 ‘시멘트로 뜬 데스마스크’로 시작된다. ㄱ이라 불리는 한 여자의 이야기다. 그 여자의 집에는 우연한 계기로 함께 살게 된 두 동거인 ㄴ( 밴드의 베이스 연주자로 가족 직업을 전전하며 떠돌았던 남자)이라는 남자와 ㄷ(신분을 위장하고 살아온 탈북자 처녀)이라는 여자가 있다. 세 사람은 함께 먹고 웃고 놀고 그리고 함께 잔다. 포개어져서 때로는 덩어리의 느낌으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지? 파트너를 교환하는 성적 취향도 아니고 게임도 아닌데 박범신은 사랑으로 그렸다. 그것이 은교와 닮았으면서도 확연히 다른 점이다. 사랑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관계.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관계. 셋이지만 둘씩은 사랑을 주고받고 교감할 수 있기에 결국 모두가 사랑을 교감한다고 느낀다. 사랑을 욕망의 삼각형으로 그린다면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하나의 덩어리로 본다면 가능하다. 그것을 그는 소소한 풍경이라고 명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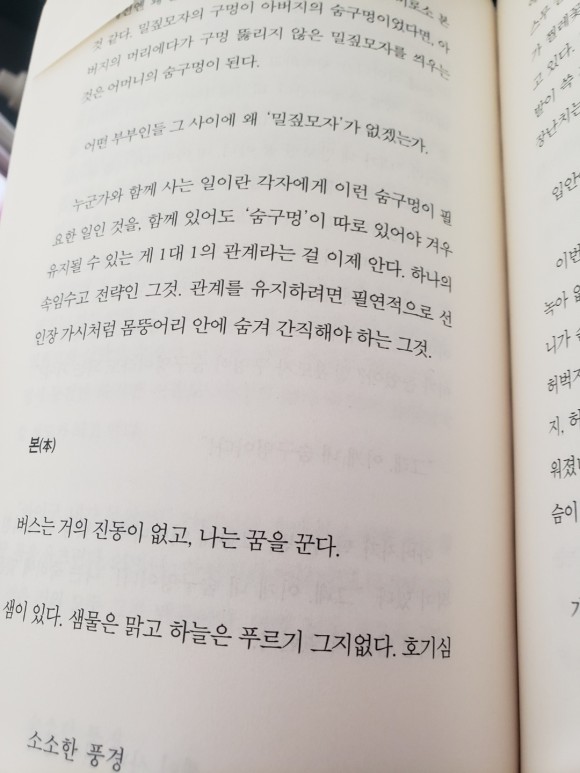
순간 작가 생 ㄱ이 이적요 시인, ㄴ이 제자 서지우 그리고 ㄷ이 발칙한 아이 은교로 성립이 된다. 셋의 사랑이라니. 은교를 읽었을 때처럼 나는 다시 한번 작가 박범신의 취향을 생각해 보게 된다. 은교 참 재밌었지. 아이들 뛰어노는 놀이터 의자에 앉아서 맥박도 빨리지듯 책장 넘기는 손조차 속력이 붙어서 제어할 수 없었던 마음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생생하다.

소소한 풍경저자박범신출판자음과모음발매2014.04.30.
이 책은 은교의 연장선에 있는 느낌이 들었다. 은교에서 하지 못했던 사랑을 조금 더 확장시킨 느낌이랄까. 은교에서 섬뜩하게 놀랐던 경험이 있은지라 책 서두부터 흐르던 ‘시멘트 데스마스크’를 ㄴ의 얼굴로 그려보며 읽게 되었다. 역시 숨 가쁘게 책장이 넘어간다. 훨씬
사랑에는 이별이 따라오듯 이별에 대한 슬픈 예감은 소설 전반으로 짙게 깔려 있다. 게다가 ㄱ, ㄴ, ㄷ 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 상처와 사연으로 엮여있다. 선인장을 좋아하는 ㄱ. 그들 모두는 선인장의 가시처럼 마음속 깊이 박힌 상처들을 안고 사는 존재다.

ㄱ은 어려서 부모와 오빠를 잃었고 결혼을 했지만 상처를 안고 이혼을 한 채 ‘소소’라는 지역에 내려와서 살고 있다. ㄴ은 1980년 5월에 형과 아버지를 광주에서 잃고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요양소에서 생을 연장하고 있으며 자신은 떠돌이로 살아가는 남자다. ㄷ은 부모와 같이 탈북하는 중에 아버지는 읽고 어머니와 자신은 짐승 같은 남자에게 착취당하며 살았다. 조선족처럼 위장하고 떠돌다 소소에 오게 되었다.

물은 죽은 자들을 환기시킨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삭제되지 않는 한 그들은 다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뿐이다. 물을 만나면 그들은 재생되어 우리 곁으로 흘러온다..
에필로그, 중에서
ㄴ은 어느 때부터인가 집 마당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우물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우물이 완성되는 날이 가까워올수록 셋은 모두 똑같이 느끼게 된다. 헤어질 날이 다가오는 것이라고.
그들은 암묵적인 계약을 맺은 상태다. 우물이 완성되면 모두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서로에 대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묻지 않는 것이다.
물의 감응이 없다면 우리가 덩어리를 이루는 것도 애당초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

우물이 완성되는 날, ㄱ이 평소처럼 세탁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누군가에게 등 버튼이 눌리듯 우물 속으로 풍덩 빠져버린 ㄴ. 그리고 그 셋은 아무 말이 없었다.
물이 없다면 완전한 덩어리, 즉 사랑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 또 소름 끼치는 거야? 이 밤 이 책 붙들고 눈은 시뻘개지고 ^^ 그러나 작가의 말로 마무리를 하며 그들을 잊기로 한다. 작가의 바람대로.
너무 오랫동안 나의 삶이 플롯 안에 들어 있었다는 자각이 나를 아프게 사로잡았다. 이야기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소한 풍경’이라는 제목이 불현듯 떠올랐다. …. 나의 깊은 우물 혹은 정적으로부터 포르르르 퐁, 퐁, 솟아올라온 작은 물방울들을 짜깁기했더니 ‘소소한 풍경’이 되었다. ‘소설’이라는 이름으로 억압당하지 않고 쓸 수 있어 매 순간 당황스럽고 매 순간 행복했다.
오아시스가 아름다운 것은 사막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종족에게 그것이 비밀이기 때문일는지도 모른다. 그러니 읽고 나선 부디 그들을 기억에서 지워주기 바란다. 그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이 가졌을지 모르는 불멸에의 꿈도 그렇다. 감히 ‘비밀’의 봉인을 열고자 한 나에게 죄 있을진저.
작가의 말, 중에서
'북 카페 > 한 권의 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엄마의 자존감 공부 (0) | 2020.08.06 |
|---|---|
| 미술 문지방? 가볍게 넘는다: 방구석 미술관 (0) | 2020.08.06 |
| 청춘의 독서 (0) | 2020.08.03 |
| 왜 세계의 가난은 사라지지 않는가? (0) | 2020.08.03 |
| 어떻게 살 것인가? (0) | 2020.08.03 |



